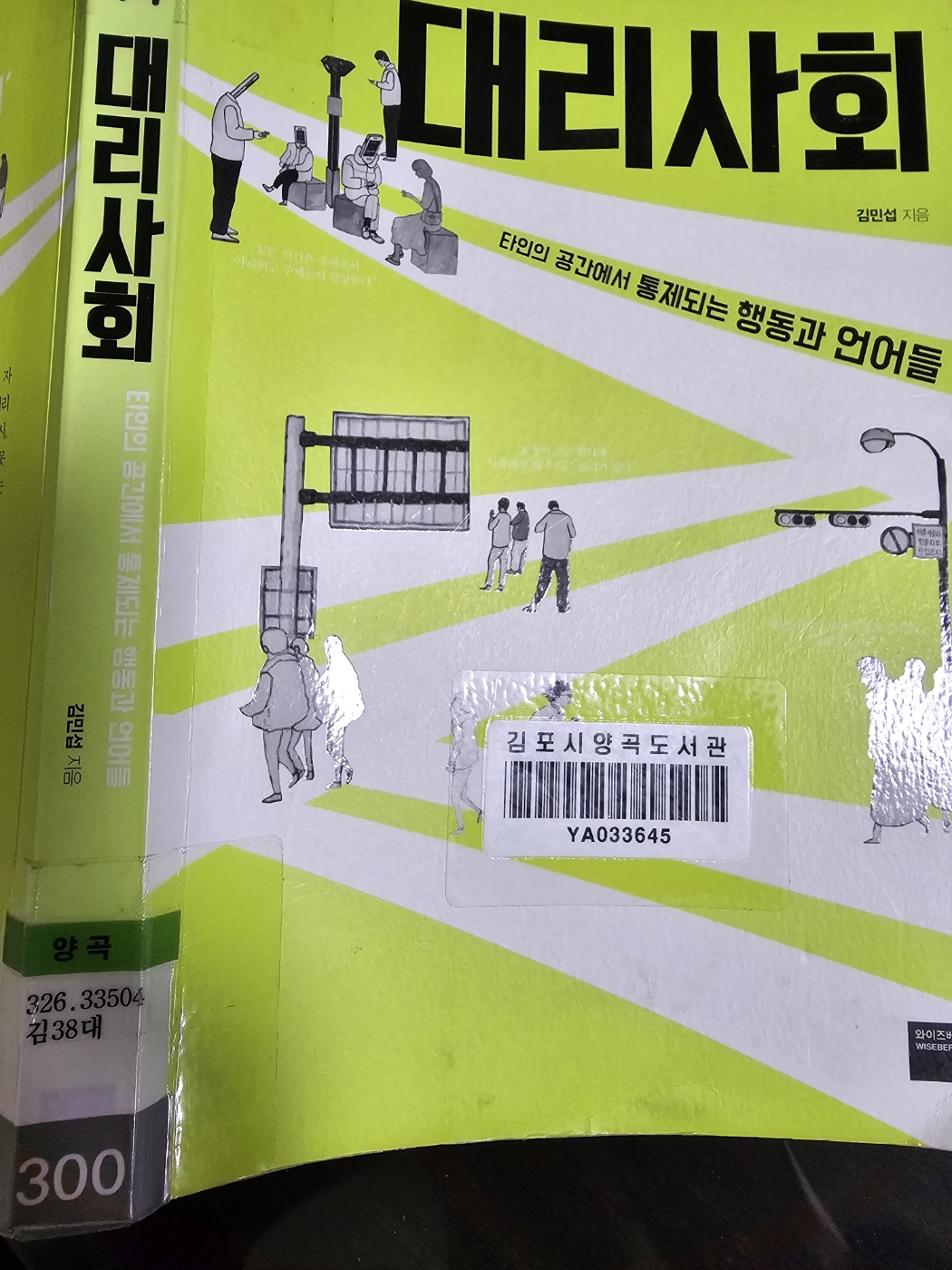
추천의 말
4쪽
하기야 몸이 거하는 모든 곳에서 주체로 설 수 있는 이는 누구인가. 모두 '갑'을 욕망하면서 '을'의 공간을 체제의 필연인 양 받아들이고 있을 뿐 아닌가.
홍세화 -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 저자
5쪽
독자를 반성하게 하면서도 분노와 증오의 감정은 일절 찾아볼 수 없는 선량한 문장을 존경한다.
장강명 - <한국이 싫어서>, <우리의 소원은 전쟁> 저자
25쪽
연구할수록 가난해지고, 강의할수록 힘들어지는데, 대학은 '학문의 길은 원래 그런 것'이라는 환상과 검열을 강요합니다. 사실 인문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그러한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만, 그것은 연구자들의 자존감에 맡겨두어야 합니다. 노동에 따른 보수를 지급할 사용자 측에서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닙니다. 특히 스스로 자본의 괴물이 되어버린 대학에게는 학문의 신성함을 무기 삼을 자격이 없습니다.
77쪽
스스로 한 발 물러서서 타인의 눈으로 자신의 공간을 바라보는 일은 절대로 패배가 아니다. 오히려 괴물에 잡아먹히지 않은 주체들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행위다. 그러고 나면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행동과 말은 통제되더라도 사유하는 주체로서 존재할 수 있다.
119쪽
타인의 운전석은 대화의 가능성이 가장 차단된 공간이면서, 동시에 무한대로 열려 있는 곳이기도 하다.
147쪽
하긴, 대리운전을 하다 보면 어느 도시의 모습이 입체적으로 들어온다. 고립되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도시와 소통 가능한지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정류장이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광역버스는 얼마나 있고 몇 시까지 다니는지, 여기에서 나가는 사람이 많은지 들어오는 사람이 많은지, 그래서 그 도시가 살아 있는지 죽어 있는지 보인다. 그에 더해 그 도시의 사람들이 대리운전 기사를 대하는 표정과 말투에서도 많은 것이 읽힌다.
172쪽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노동에 필요한 모든 물품과 환경을 제공하고, 노동자는 사용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 그것이 내가 배운 '노동'의 관계다. 그 업장이 아니면 어디에서든 입을 수도 없는 유니폼을 구입하기 위해 돈을 지출하고 싶지 않았다.
172쪽
노동의 관계도는 가장 간단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사용자와 노동자가 계약의 주체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 그만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사용자는 그 중간에 '대리인'을 끼워 넣기 시작했다. ...... 기업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노동자의 주체성을 농락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매장의/학교의 주인처럼 일하라'는 수사가 누구에게나 익숙하다. 이것은 정말이지 파렴치한 역설이다. 노동자의 주체성을 강탈하는 동시에 그 빈자리에 '주체'라는 환상을 덧입히는 것이다. 그것이 일상화된 사회에서는 자신을 주체로 믿는 대리가 된 노동자만이 존재한다. 어쩌면 '열정 착취'보다도 한 단계 진화한 방식이다. 노력뿐 아니라 행복과 만족까지도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것을 '영혼 착취'라고 규정하고 싶다.
181쪽
뭐랄까, '동류'이지만 '동료'가 될 수 없는 사이였다. 카카오와 비카카오 기사들 간에는 그러한 위화감이 흘렀다. 자본을 가진 갑과 갑의 전쟁에서 피해자가 된 것은 결국 노동의 주체인 '을'이었다. 너와 나를 구분하고 어느 편에 서야만 했으며, 그렇게 자연스레 '갑의 대리인'으로서 참전했다.
192쪽
언젠가부터는 타인의 자살을 두고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라고는 도저히 말을 못 하겠다. 그것을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폄하하고 싶지도 않다. 다만,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하면 먹먹해진다.
195쪽
가족적 우애가 노동에 대입되는 것은 전근대적인 폭력이 되기 쉽다. 그 과정에서 비상식이 상식으로, 비합리가 합리로 탈바꿈하게 된다.
210쪽
"그러니까 마치, 우리에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맛있는 걸 먹고 노래나 부르면서 다 잊으라고 하는 것 같아서, 당장은 재밌어도 조금 지나고 나면 허탈해져요."
...... 하지만 그러한 대리만족은 오래가지 않는다. 곧 누구에게도 대리시킬 수 없는 허탈함이 찾아온다. 특히 자신을 둘러싼 사회구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남들처럼 즐거울 수 없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여기게 된다. 일상을 특별하게 재현한 지금의 먹방은 보는 이를 더욱 외롭게 만든다.
236쪽
나는 대리운전 기사다. 지문 잠금이라니, 그렇게 생체 정보를 입력하고 화면을 잠가두어야 할 만한 여유는 나에게 없다. 센서가 지문을 인식하는 1초는 너무나 길고, 말하자면 사치에 가까운 시간이다. 나는 곧바로 핸드폰에 걸린 모든 잠금을 풀었다. 나는 이 기계가 보내는 모든 신호에 즉각 반응해야만 한다. 눈을 깜빡이거나, 코로 숨을 쉬거나, 귀로 듣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한몸이 되어 교감해야 한다. 핸드폰은 나와 연결된 하나의 생체, 외부의 장기와도 같은 존재다. 그러지 않으면 거리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242쪽
우리에게 선사한 편안함과는 별개로 기계는 사람의 노동을 은폐시키고 그 너머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하게 한다. 게다가 우리가 느끼는 편안함만큼 기계의 발전에 밪춰 노동환경이 개선되는 것도 아니다. 특히 기계를 위한 매뉴얼은 있어도 사람을 위한 매뉴얼은 없다. 기계만큼이나 복잡하고 치밀한 법과 제도만이 노동자를 옭아맨다. 합리와 효율이라는 허상은 쉽게 보이고, 그 너머의 사람이 어떠한 처지에 놓이는가는 잘 보이지 않는다.
...... 도시는 언제나 그 공간이 품은 사람만큼의 폐기물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누구도 그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 그렇게 보이지 않는 시공간으로 밀려난 노동이 있다. 우리는 쓰레기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처럼, 그것이 사라지는 과정 역시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 가려진 노동, 숨은 노동자, 그렇게 밀어냄에 따라 밀려난 그림자와 같은 이들이 언제나 주변에 있다. ...... 기계 너머의 타인을 상상하기란 점점 어려운 일이 되어가지만, 결국 그들을 주체로서 고양시키는 일은 역시 사람의 몫이다.
246쪽
지식과 노동을 계속 양손에 들고 교차 방문하는 삶을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건 의외로 대단히 멋진 삶이 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248쪽
조직의 시스템이 가진 어느 균열이 희미하게나마 눈에 들어온다. 그래서 조금 더 중심부에 다가서게 되면 그것을 곧 바로잡겠다고 마음먹는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경계에서 멀어질수록 그 균열은 점차 보이지 않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경계를 완전히 벗어나고 나면 그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믿게 되는 것이다.
251쪽
우리는 모두가 한 사람의 대리운전 기사다. 자신이 그 차의 주인인 것처럼 도로를 질주한다. 하지만 조수석에는 이미 누군가가 자리를 잡고 앉아 있다. 시동을 걸기 이전부터 거기에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것을 인식하기란 쉽지 않다. 그들의 욕망은 내비게이션을 통해 끊임 없이 전달되고 개인의 의지는 통제되고 검열된다. 차를 멈추고 운전석에서 잠시 내려, 그렇게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면 어느 균열의 지점이 보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액셀을 더 강하게 밟는 데만 힘을 쏟는다. 단속 카메라가 보이면 브레이크를 밟고, 경로를 이탈했다는 경고음에 다시 도로로 올라오면서도, 자신이 주체라는 환상에 빠져 계속 운전대를 잡는다. 그렇게 대리사회의 욕망을 대리하는 '대리인간'이 된다.
[네이버 책] 대리사회 - 김민섭
'몽자크의 책갈피'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책잡기-2023-059] 멀고도 가까운 - 리베카 솔닛 - 별 셋 - 1104 (1) | 2023.11.04 |
|---|---|
| [책잡기-2023-058]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 - 홍세화 - 별 넷 - 1101 (2) | 2023.11.01 |
| [책잡기-2023-056] 나는 지방대 시간강사다 - 309동1201호 - 별 넷 - 1025 (1) | 2023.10.25 |
| [책잡기-2023-055] 비행운 - 김애란 - 별 셋 - 1021 (0) | 2023.10.21 |
| [책잡기-2023-054] 낯선 시선 - 정희진 - 별 다섯 - 1018 (2) | 2023.10.18 |

